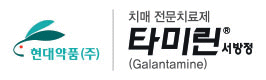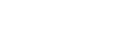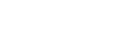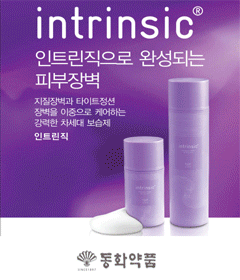면역항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 후보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와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에 관여하는 효소 ‘TPST2*’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분자 화합물 ‘77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와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에 관여하는 효소 ‘TPST2*’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분자 화합물 ‘77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GIST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생명과학과 박수빈 박사, 의생명공학과 김현 박사
연구팀은 이 물질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돕는 새로운 면역항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 TPST2(Tyrosylprotein Sulfotransferase 2): 단백질에 ‘황산기’라는 화학 성분을 붙여 그 성질을 바꾸는 효소다. 이 효소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생존율 향상 효과가 커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암종에서는 치료 반응률이 15~40% 수준에 그쳐,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다양한 기전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면역 감작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면역 감작제는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공격하도록 돕는 약물로, 기존 면역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기대되고 있다.
* 면역항암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암세포가 면역계의 억제 신호(PD-1 등)를 이용해 공격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 T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약물이다.
연구팀은 TPST2 효소가 암세포의 면역 회피에 관여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종양에 대한 T세포* 면역 반응을 크게 향상시키는 저분자 화합물 ‘77c’를 개발했다.
TPST2는 인터페론 감마(IFN-γ)* 신호 경로에 작용해 종양 미세환경(TME)*에서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TPST2 억제제를 활용해 종양이 면역세포에 더 잘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체내 면역계가 암세포를 더욱 강하게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 T세포(T cell): 면역계의 핵심 세포로,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인식해 공격한다. 특히 CD8+ T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면역항암 치료의 핵심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 IFN-γ(인터페론 감마, Interferon-gamma): T세포와 NK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면역 신호물질로, 면역세포 활성화와 암세포 제거를 촉진해 항암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 TME): 암세포를 둘러싼 혈관, 면역세포, 섬유아세포, 신호전달물질, 세포외기질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세포 환경을 말한다. 이 미세환경은 암의 성장과 전이, 약물 저항성, 면역 회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한국화합물은행(KCB)이 보유한 방대한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많은 후보물질 중에서 TPST2 효소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검증(스크리닝)하고 약물 구조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통해 TPST2를 표적으로 하는 최종 후보물질 77c를 도출했다.
실험 결과, 77c는 TPST2 효소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마우스 대장암 세포(MC38)를 이용한 세포 실험에서 77c를 처리 시 TPST2 활성이 감소하면서 인터페론 감마(IFN-γ) 신호가 강화되고, 면역 신호전달 단백질 Cxcl10*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이로써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더 잘 노출되고 공격받기 쉬운 ‘면역 활성화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 Cxcl10(C-X-C motif chemokine ligand 10): 면역세포 간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암세포나 염증 부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주로 인터페론 감마(IFN-γ)에 의해 생성되며,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암 연구에서는 Cxcl10의 발현이 높을수록 면역세포의 종양 침투와 항암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표로 사용된다.
후보물질 77c는 사람의 대장암 세포를 이식한 실험용 생쥐 종양 모델(마우스 대장암 세포 이식 종양 모델)에서도 탁월한 항암 효과를 보였다.
단독 투여만으로도 종양의 성장 속도를 54% 억제했으며, 체중 감소 등 부작용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면역항암제(anti-PD-1 항체*)와 함께 투여했을 때는 종양 성장 억제율이 약 80%까지 높아져, 두 약물 간의 뚜렷한 상승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77c를 투여하자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CD8+ T세포 등 면역세포가 종양 조직 내부로 더 많이 침투했고, 암을 기억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CD8+ T세포*와 NK 세포 등 항암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활성이 전신 면역계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7c가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만든 것이다.
* anti-PD-1 항체(항PD-1 항체): T세포의 면역 억제 단백질인 PD-1의 작용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면역항암제다.
* CD8⁺ T세포: 체내 면역계에서 감염되거나 암으로 변한 세포를 직접 인식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독성 T림프구이다. 세포 표면에 CD8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불리며, CD8⁺ T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살상 세포’로서 면역항암제의 주요 작용 대상이자, 항암 면역 반응의 활성 정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팀은 세포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분자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 분석과 분자동역학(MD)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77c가 TPST2 효소의 핵심 결합 부위에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7c가 실제로 TPST2를 직접 억제한다는 분자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실험에서 관찰된 면역활성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용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TPST2가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항암 치료 표적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며, “TPST2를 억제함으로써 기존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가 면역항암 치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IST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와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의 공동 지도 아래, 생명과학과 박수빈 박사와 의생명공학과 김현 박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과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선도연구센터(IRC)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10월 30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한편 GIST는 이번 연구 성과가 학술적 의의와 함께 산업적 응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기술이전 관련 협의는 기술사업화센터(hgmoon@gist.ac.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1] TPST2 저해제 77c의 면역활성 및 항암효과.

[그림2] TPST2 저해제 77c의 효소 저해 특성 및 결합 구조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