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방사선의학연구과 김주영 박사 연구팀이 방사선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의 다중오믹스 분석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여성암으로, 발생율과 사망률이 전 세계 여성암 4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시행하지만 종양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암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원격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면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로 한다. ▲ 김 주영 박사 최근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며 자궁경부암에도 신약의 사용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자궁경부암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잘 밝혀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소 획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첨단 단백체 분석기법을 통해 실험된 결과를 유전체, 전사체실험기법과 함께 통합 분석해 자궁경부암을 6개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으로 도출했다. 이 중 3개의 특성은 치료 예후가 좋은 환자군, 나머지 3개의 특성은 치료 예후가 나쁜 환자군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특성에서 분자생물학적 특징과 바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 비뇨의학과 강석호 교수 연구팀(강석호 교수, 심지성 교수, 노태일 교수, 윤성구 교수)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원장 오상록) 정영도 박사 연구팀(정영도 박사, 이관희 박사, 금창준 박사 후 연구원, 염혜진 연구원)이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광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침습적 검사 없이도 소변 샘플만으로 방광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네이처 자매지(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KIST와 고려대 의대의 임상중개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어진 성과로, 다기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방광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5%에 달할 만큼 완치율이 높지만, 재발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어렵고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진단이 늦어지면 방광 전체를 제거하게 되어 인공 방광을 만들거나 소변 주머니를 착용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존의 방광경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침습적 검사의 한계점으로 고통과 감염 위험이 따르며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의약품 중 하나인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위식도역류질환(GERD)과 그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약학대학 노윤하 교수와 캐나다 맥길대학교의 로랑 아줄레이(Laurent Azoulay) 교수 공동연구팀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GLP-1 RA가 위식도역류질환(GERD) 및 그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의 대표적인 일차의료 데이터베이스 (CPRD·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 노 윤하 교수 연구팀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GLP-1 RA)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2만4,708명과,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SGLT-2 억제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8만9,096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GLP-1 RA(관심약물) 사용 환자는 SGLT-2 억제제(비교약물) 사용 환자에 비해 3년 이내 위

휴가철 해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물놀이 이후 발생하는 중증 감염병에 대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과 봉와직염은 감염 시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는 급성 패혈증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많은 사람들이 생선회, 조개류를 먹고 감염되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잠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체 감염자 중 약 3~40%는 해수 접촉을 통한 감염이며, 특히 바닷물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 주 은정 교수 한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은 매년 5월부터 환자가 산발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해, 7~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해수 온도가 18℃ 이상에서 급격히 증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고수온기와 감염 발생 시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전역에서 매년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0~2024년 동안 총 2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025년 첫 환자는 5월 1일경 발생했으며,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 재활의학과 김범석·나용재 교수의 ‘허리 수술 후 통증 관리’에 관한 국내 대규모 연구결과가 유럽 척추학회지(European Spine Journal) 2025년 7월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요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의 약 절반 가까이가 수술 이후에도 반복적인 통증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수술 이후의 통증 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좌측부터)중앙대광명병원 재활의학과 나용재·김범석 교수,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권우근 교수 약 8만 3천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추 유합술 이후 3년간 척추 주사치료의 빈도와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재활의학과 김범석·나용재 교수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신경외과 권우근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36.1%는 경막외 차단술을, 12.8%는 내측 분지 차단술을, 6.2%는 후관절 차단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30%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절반 가까이는 1년 이내에 첫 통증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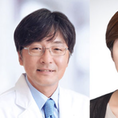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소아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MMD)을 혈액 검사만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 miR-512-3p라는 특정 마이크로RNA(miRNA)의 수치가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바이오마커는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야모야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표적으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 ㈜제이엘케이 고은정 박사,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최승아 연구교수 연구팀은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의 혈장에서 miR-512-3p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그 기능과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 ㈜제이엘케이 고은정 박사,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최승아 연구교수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의 가지치는 부위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이다. 이로 인해 혈류가 부족해지고,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려는 비정상적인 미세혈관들이 자라나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 정형외과 노규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 IF=4.9)’에서 2024년 최다 열람 논문(Top View Papers)으로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2024년 11월 발표된 후 2025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6500명 이상의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열람하며 국제적 관심을 입증했다. IJMS는 생화학·분자생물학·분자의학·분자물리학 등 분자 수준의 기초·응용연구를 다루는 국제 오픈액세스 학술지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퇴행성 건병증 치료의 최신 접근법: 효능 평가와 도전 과제(Advancements in Therapeutic Approaches for Degenerative Tendinopathy: Evaluating Efficacy and Challenges)’로 퇴행성 건병증의 병태생리와 치료법의 현재를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 노 규철 교수 노 교수는 논문에서 기존 퇴행성 건병증 치료법의 효과 및 한계를 짚고, 최근 각광받는 재생의학 기반 치료법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자가 혈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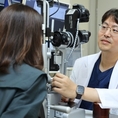
A씨는 최근 더위를 피해 바다로 피서를 다녀온 뒤 눈이 충혈된 것을 발견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물감과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진단받았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영장, 계곡, 바다 등으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물놀이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급증하는데, 이를 단순한 눈의 피로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만성화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김 동현 교수 진료사진 결막염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점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으로 구분된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며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전염력이 높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옮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형태다.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되며,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하거

아주대·가톨릭대 공동 연구팀이 mRNA 치료제의 핵심 구조로 그동안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던 ‘poly(A) 꼬리’의 길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 감염병과 암, 유전질환 등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는 m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의 품질관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대찬 아주대 교수(첨단바이오융합대학·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사진)와 남재환 가톨릭대 교수(의생명과학과) 공동 연구팀은 mRNA 치료제의 핵심 구조인 poly(A) 꼬리(poly(A)denylation tail)의 길이를 정확하게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찬 교수 ▲ 남 재환 교수 해당 연구 결과는 ‘3AIM-seq: 체외 전사된 mRNA의 3’ 말단 poly(A) 꼬리 시퀀싱을 활용한 mRNA 치료제의 품질평가(3AIM-seq: Quality assessment of mRNA therapeutics using sequencing for 3′ poly(A) tails of in vitro-transcribed mRNA)’라는 제목으로 세포・유전자 치료 및 RNA 기반 치료제 분야의 저명 학술지

폐암을 비롯한 위암 등 고형암에서 ‘MET’ 유전자 표적 치료가 핵심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조병철, 이기쁨 교수, 심주성 전공의 연구팀은 과도하게 발현된 MET 유전자를 표적 치료하는 전략을 비소세포폐암(NSCLC)을 넘어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30일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종양학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임상 종양학(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IF 82.2)에 게재됐다. MET 유전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여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MET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현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를 표적 치료했을 때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돼,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주요 표적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MET 유전자 표적 치료 전략을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고형암에 확대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장암, 위암 등에서도 MET 유전자 이상이 발견돼 표적 치료가 가능해서다. MET 유전자 과발현 여부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 시기를 조절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고형암을 대상으로 MET 유전자 억제제 단독 사용은 물론, 면역항암제나 항체약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름에는 햇볕과 땀, 습한 기온 등 피부를 손상시키는 요소들이 많아 피부마저도 괴롭기 일쑤다. 또 젊은 남녀들은 해변이나 야외 수영장 등에서 태닝으로 피부를 그을려 자신의 건강미와 몸매를 과시하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광화상과 지나친 태닝은 피부노화, 색소침착 등 이차적 피부질환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 그리고 휴가철 가장 흔한 피부질환인 일광화상에 대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중선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반복적인 일광화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광화상은 햇볕 노출에 대한 정상반응이다. 햇볕을 받은 부위는 처음엔 붉어지고 ▲ 이 중선 교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고, 심한 경우 통증 및 물집 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 두통, 오한, 발열, 오심, 빈맥 등의 전신 증상과 쇼크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광화상으로 피부에 허물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벗겨내면 추가적인 손상과 흉터를 남길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벗겨지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 또 피부병변에 물집이 생긴 경우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생명과학과 김재진 교수 연구팀이 'BRD9 단백질 결핍에 의한 백혈병 세포 성장 억제 기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 융복합 유전체 연구소의 이서윤 연구교수가 참여한 본 논문은 ‘Depletion of BRD9-mediated R-loop accumulation inhibits leukemia cell growth via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라는 제목으로 핵산 생화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Nucleic Acids Research, IF 16.6)에 게재됐으며 한국인 과학자들이 발표한 우수한 생명과학 ▲(왼쪽부터) 이서윤 한림대 융복합 유전체 연구소 연구교수, 김재진 한림대 생명과학과 교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소개됐다. 이번 연구는 백혈병 세포에서 BRD9 단백질의 역할과 R-루프 축적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백혈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백혈병은 혈액암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기존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