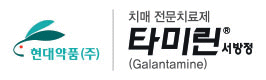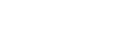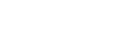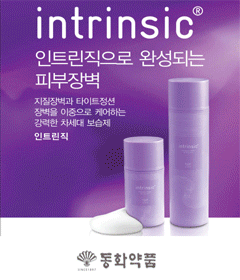심한 화상이나 만성 상처로 피부를 잃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피부 조직, 인공 재료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내 몸이 기억하는 재료’로 ‘나만의 새살’을 길러내는 기술이 등장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이준민 교수, 시스템생명공학부 통합과정 강래희 씨 연구팀이 이화여대 박보영 교수, 고려대 김한준 교수와 함께 환자 본인의 세포와 조직으로 맞춤형 인공피부 이식재를 제작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준민 교수, 강래희 씨, 박보영 교수, 김한준 교수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온라인판에 최근 소개됐다.
화상이나 만성 상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자가피부 이식법’은 이식에 필요한 건강한 피부가 부족하고, 수술 후 흉터가 남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세포 진피 매트릭스(Acellular Dermal Matrix, ADM)’나 세포 주사 요법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인공 재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세포 주사는 생존율이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해답을 ‘몸이 스스로 알아보는 재료’에서 찾았다. 집을 리모델링할 때, 다른 집 벽돌을 쓰지 않고, 원래 집의 설계도, 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처럼 말이다. 연구팀은 환자 피부에서 세포를 제거한 탈세포화 세포외기질*1 을 만들고, 이를 같은 환자에게서 얻은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와 함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다시 조합했다. 즉, 환자의 단백질 조성과 미세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본인의 조직을 다시 그 환자의 피부 재생에 쓰이도록 한 것이다.
1) 탈세포화 세포외기질(Decellularized Extracellular Matrix, ECM): 조직 속의 세포를 제거하고 뼈대 역할을 하는 단백질 및 섬유 구조만 남기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생체 유래 재료로, 세포 부착과 성장에 적합한 생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팀이 만든 맞춤형 이식재는 실제 피부와 유사한 복잡한 단백질 환경을 재현했다. 진피층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량이 기존 대비 2.45배 증가했으며, 혈관 연결점과 혈관망 형성은 각각 1.27배, 1.4배로 증가하며 산소 공급을 위한 새로운 혈관이 활발히 자라났다.
동물실험에서도 염증을 크게 줄이면서 2주 만에 완전한 피부 재생이 이뤄졌다. 표피 이동 길이는 기존 대비 약 3.9배, 진피 두께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대조군이나 일반 젤라틴 기반의 하이드로젤을 쓴 경우와 달리, 출혈·울혈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몸이 이식재를 ‘내 것’으로 인식한 덕분에 면역 거부나 흉터 형성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봉합이 가능하며, 특히 ‘당뇨발(당뇨 합병증)’과 만성 염증성 상처 등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에도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 이준민 교수는 “환자에게서 얻은 재료를 다시 그 환자의 치료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재생 치료의 혁신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박보영 교수는 “환자 맞춤형 이식재로서 분명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연구”라고 전했으며, 고려대 김한준 교수도 “환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재생의 모범 사례”라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